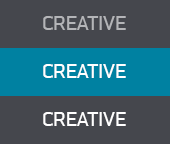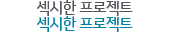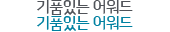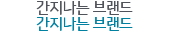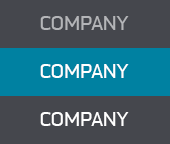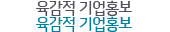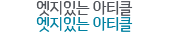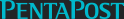생성형 AI가 일상과 산업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고, AI기반 솔루션을 통한 다양한 업무의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며 효율성을 입증하고 있다. 웹과 SNS, 마케팅 현장 또한 하루에도 수많은 이미지와 글, 영상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AI가 만들었다’는 컨텐츠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미묘하게 멀어진다.
2025년 Ahrefs의 조사에 따르면, 새로 만들어지는 웹페이지의 약 70% 이상이 AI가 쓴 문장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영국의 TechRadar는 “AI가 쓴 글의 양이 이미 인간의 글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AI가 만들어낸 문장과 이미지는 이제 인터넷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AI가 만들었다’는 사실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선다.
‘AI가 만들었다’는 꼬리표가 만든 거리감
MIT Sloan School of Management 산하 MIT Initiative on the Digital Economy(IDE)의 연구팀은 AI가 만든 콘텐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실험적으로 분석했다.
같은 내용이라도 ‘AI가 생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참가자들은 콘텐츠의 진정성과 신뢰도를 낮게 평가했고, 보고서에는 “참가자들은 AI 콘텐츠의 품질은 높이 평가했지만, 인간의 손길이 느껴질 때 더 큰 신뢰를 보였다.”로 기록되어 있다.
결국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AI를 썼다’는 꼬리표가 만드는 심리적 거리감이다.
기술보다 인식의 벽이 높다
2025년 Journal of Business Research에 게재된 C. P. Kirk 등의 논문 「The AI-Authorship Effect」 역시 같은 맥락을 보여준다.
AI가 작성한 감성 마케팅 문구는 효율성과 일관성 면에서는 뛰어났지만, 해당 콘텐츠가 AI에 의해 생성된 것임을 알렸을 때 소비자들이 느끼는 진정성과 신뢰도가 낮아지고,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충성도 또한 감소했다.
연구진은 이를 “AI 작성물에 대한 감정적 거리감”으로 설명했다.
AI 컨텐츠의 이질감이 아니라, 우리가 그 결과를 차갑게 바라보는 인식이 강하다는 증거이다.
기획자의 시각
AI에 대한 반감은 기술의 한계가 아닌 결과물이 사람의 마음에 닿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기획자는 이제 단순히 AI를 활용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사람의 의도와 감정을 결과물과 같이 전달할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AI 컨텐츠의 경쟁력이 기술의 완성도에서 결과물 속 감정의 온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AI를 사용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결과 뒤에 있는 인간의 손길과 선택을 보여주며, 효율보다 메시지를 설계하는 감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AI를 효율성의 도구가 아닌, 사람의 감정을 더 깊이 전할 수 있는 새로운 붓으로 보는 바라봐야 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