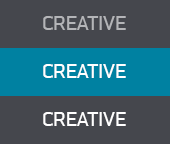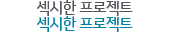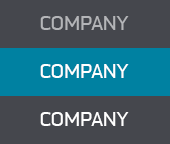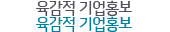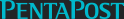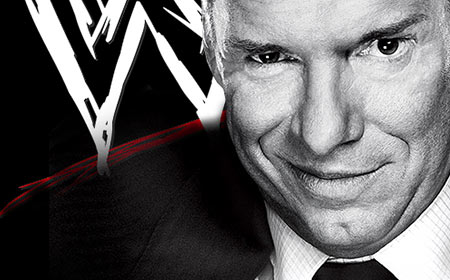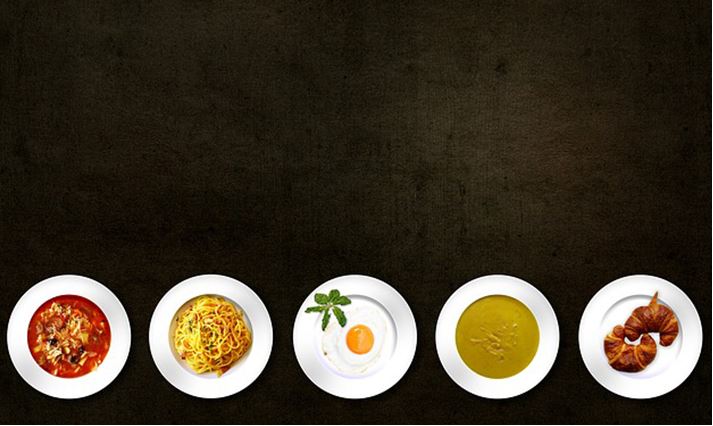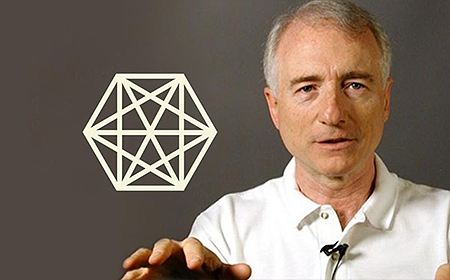어떻게 하면 그녀의 옷장을 비울 수 있을까?
20세기 초, 나일론으로 대표되는 합성섬유가 발명된다. 그러자 수 천년 동안 이어져 온
‘옷’에 대한 패러다임은 송두리째 흔들린다. 이전까지 천연소재로 만들었던 옷들은 낡아 헤지면 그 수명이 끝나는 것이었지만, 합성섬유는 성질이
하도 튼튼한지라 어지간해서는 닳지도 찢어지지도 않았다. 이것은 소비자들에게 좋은 소식이었지만, 의류 제작자들에게는 당장 생존을 고민해야 할
만큼의 큰 문제였고 위협이었다.
이때, 더욱 튼튼한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이 기존의 옷을 버리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들이 바로 오늘 소개하는 샤넬을 비롯한 디오르, 발렌시아가 같은 디자이너들이다. 그들은 ‘옷을 만들어 내는 재봉산업’을 ‘유행을 파는 패션산업’으로 바꾸어 버린다. 프레타
포르테가 시작되었고, 소비자들은 기꺼이 지난해 봄에 사서 몇 번밖에 입지 않은 원피스를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처박고 새 옷을 사기 위해 지갑을
열어주었다. 어떻게 이 현상이 가능했을까? 새로운 봉제 기술이나 디자인, 텍스타일의 발전 때문은 아니었다. 오늘 샤넬을 소개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샤넬은 그 자체로 유행을 초월한 시대의 문화이며 스타일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펜타브리드를 가지고 있어요.
샤넬은 단순한 디자이너가 아니라 ‘예술의 허브’였다. 피카소, 스트라빈스키, 달리, 장 콕도 같은 당대의 예술가들이 샤넬의 세계 안에 있었다. 샤넬은 그들과 함께 샤넬만의 스타일을 쌓아 낸다. 우리가 잘 아는 리틀 블랙드레스, 어깨 끈이 달린 퀄팅 백, 그리고 No.5 향수 같은 것들 말이다. 여성들이 치마를 벗고 새로 입은 것은 바지가 아닌 억압에서의 해방이었다. 그녀들이 어깨에 맨 것은 가방이 아닌 양손의 자유였다. 샤넬이 만들고 판매한 것은 옷과 가방이 아닌 ‘샤넬’이었다. 바로 이 지점이 동시대의 수많은 유명 디자이너, 그리고 지금까지도 쏟아져 나오는 브랜드들과 샤넬의 차이가 되었다.
샤넬은 말했다. “유행은 지나간다. 하지만 스타일은 영원하다.” 우리는 광고와 캠페인 만들고 세상은 소비한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존 것을 버리고 또 만든다. 그 자체로는 유행에 편승하는 단순 용역일 뿐이다. 하지만 이 작업에 우리만의 문화가 표현되어 진다면, 그것은 고유한 ‘스타일’이 된다. 우리는 무엇을 꿈꿔야 할까? 이미 샤넬이 설명해줬다.우리의 클라이언트들이 ‘나는 펜타브리드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누군가는 그것을 부러워하는. 그런.